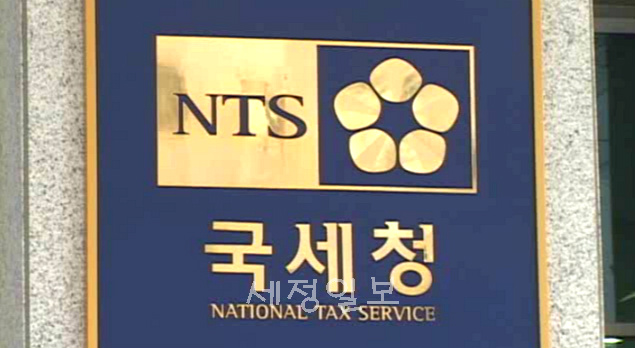
세수가 걱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벌써 올해도 8~10조 원 가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다 아는 사실이지만 복지공약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실천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아예 복지공약을 폐기하던지, 아니면 실천을 위해서는 세율을 올리라고 다그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무슨 소리냐. ‘세율인상은 없다’며, 비과세·감면정비와 세출구조조정으로 가능한 맞춰보겠다고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는 비과세·감면정비를 계획대로 다 이루어내지 못했다. 기억나는 것 하나. 세무사들에게 주어지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지 못했듯이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이거 한방으로 650억 원의 세수가 날아갔다.
이런 판국에 국세청에게만 세수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옳지 않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수확보 대책은 대강 이런 것이었다.
비과세·감면축소, 세출구조조정, 세무조사를 활용한 지하경제양성화 등이었다. 135조 원 중 84조 원 정도는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51조 원은 세입기반확충 즉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과세?감면은 앞서 설명한대로 쉽지 않다. 세출구조조정도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지하경제양성화는 어떤가. 솔직히 뜬구름 잡는 식이다. ‘왕, 왕, 왕’하면서 이름을 붙여 역외탈세범을 잡아 넣어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빠져나오고 있다. 그리고 어떤 ‘왕’의 경우 떠들썩하게 조사를 벌였지만 아예 세금을 고지조차 하지 못하고 풀어주었다.
그렇다면 정말 복지공약의 실현을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인가.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혔듯이 경기활성화가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경제성장률 1%에 세수 2조원이라는 경제상식에 대입하면 지난해 모자란 세수 8조5천억 원 정도는 지금보다 경제가 4%만 더 성장해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일인가. 이또한 한마디로 난망한 일이다. 10대그룹이 쌓아 놓은 현금만 4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투자가 안되고 있는 것이다. 투자가 안되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경기가 활성화 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은 몇 푼 안받는 봉급쟁이 근로자들에게 집 장만 할 저축은 하지 말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흥청망청 다 써버리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럼 정말 방법은 없는가.
어떤 학자는 탈루율이 높으니 세무조사 비율을 많이 높이자고도 하고, 또 법인세를 폐지하고 소득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법인의 원천소득을 주주에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면 세수가 오히려 증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세제와 세정의 근원적 문제인 간이과세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하자고 한다. 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걸 모두 한다고 예상되는 부족세수 8~10조 원을 보충할 수 있을까. 조세개혁이라는 말은 들을지 모르겠지만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런 진부한 얘기 말고 다른 것 하나 제안한다.
삼성에게서 받아내자. 아니 삼성 같은 대그룹들이 스스로 내게 하면 어떨까. 지난 2008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대선불법자금, 안기부X파일 사건 등으로 사재 8천억 원을 선뜻 내놓았다. 물론 세금으로 쓰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자금 수사를 받던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1조원을 내놨다. 이 또한 세금으로 쓰이지 않았다. 말인즉슨 이들에게는 이런 돈이 있다는 것이다. 기분이 좋거나 궁지에 몰리면 낼 수 있는 돈이지만 어쨌든 있다는 것이다.
기자의 이야기는 궁지에 몰려 내는 그런 돈이 아닌 이들에게 스스로 내게 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삼성의 롤모델로 알려지기도 한 스웨덴 최대의 기업이자 가문인 ‘발렌베리그룹’처럼 매년 그룹 이익의 85%를 법인세로 내게하자는 것이다. 이 기업은 이처럼 매년 엄청난 세율의 법인세를 기꺼이 낸다고 한다. 대신 스웨덴은 이 기업에게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해 주인 오너 일가의 주식에 10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이 가문에게 기업의 경영권을 국가와 사회가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해 삼성그룹이던 현대차그룹이던 원한다면 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이들 그룹들은 탄탄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받고, 국가는 세금이라는 수확물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솔직히 지금 부족한 세수는 그룹 몇개도 필요없다.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채우고 남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한해 동안 228조69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36조7900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여기에 법인세 85%를 낸다면 얼마일까.
아마도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의 실현은 물론 더 많은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당연히 이들 오너 그룹들 역시 재산증식만을 위해 기업을 경영한다는 비판보다는 막대한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가치 실현을 넘어 국민들로부터도 존경받는 기업이자 가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발렌베리는 5대째 세습경영을 하면서도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