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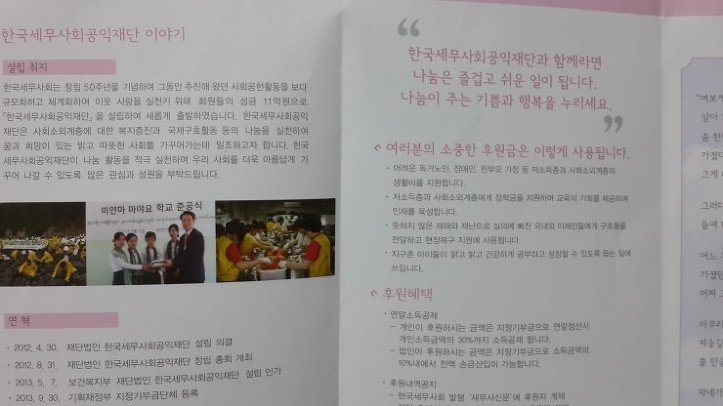
나는 세무사다.
교회에 다닌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낸다.
나는 세무사다.
연간 회비를 낸다. 그리고 또 실적회비도 낸다.
나는 세무사다.
지역세무사회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세무사회 회비도 내야한다.
나는 세무사다.
세무사시험으로 데뷔했다. 그래서 세무사고시회 회비도 내야한다.
나는 세무사다.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이 생겼다.
공익재단 회비도 낸다. 1년에 두 번씩 강제적으로 내야한다.
회원 1만명 연간 4억원이 걷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연간 120억원으로 늘린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래처 사장들에게 부탁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거래처가 20개도 안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태산이다.
혹여 세무사회장(공익재단 이사장)에게 밉보이지나 않을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새내기 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쓴 기자의 창작시이다.
시를 써 놓고 3일쯤 지나 우연히 세무사인 후배와 전화 통화를 했다.
개업한지 2년. 거래처 고작 00개.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기장료 받기도 급급한데 게다가 세무사회 공익재단에 후원하라는 말까지 해야한다고? 도무지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봉사를 하는데 금액이 많아야 생색이 나는 것인가요.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회원들의 거래처까지 동원해야 하는 것인가요. 거래처 사장님들도 각자 나름대로 봉사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닐 텐데 세무사들까지 후원하라고 요청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속사포처럼 오히려 기자를 쏘아붙였다. 세무사회를 출입하면 이런 말 좀 전하라면서.
후배와의 통화가 끝난 후 몇 달 전 현직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사견을 전제로 밝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기부란 가슴으로 하는 것이며, 또 회원들의 거래처가 갑(甲)의 입장인 현실에서 세무사회가 사회공헌하려고 하니 후원금을 내는 회원이 되어 주세요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였다.
그는 또 “거래처로부터 후원금을 지원받는 일이 자발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강제성을 띄게 되어 경기불황으로 미수업체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아무리 사회공헌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회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익재단의 설립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돈을 많이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1만여 회원이 마련한 공익회비로 세무사회가 조금이나마 사회에 공헌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감사의 지적은 봉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하는 것이며, 또 '내 돈으로 봉사를 해야지 왜 남의 돈으로 나를 생색내려 하느냐'하는 말로도 들렸다.
이런 지적에도 세무사회는 지금 매머드 공익재단의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12월 12일 정부 고위관계자, 정당대표와 국회의원, 언론계, 학계 등 내로라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대대적인 출범식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