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에게 신고 맡기고 영업만 하던 A세무사
징계위 회부되자 책임 회피…사무장에게 전가
세무사 신뢰도 하락…징계수위 높이란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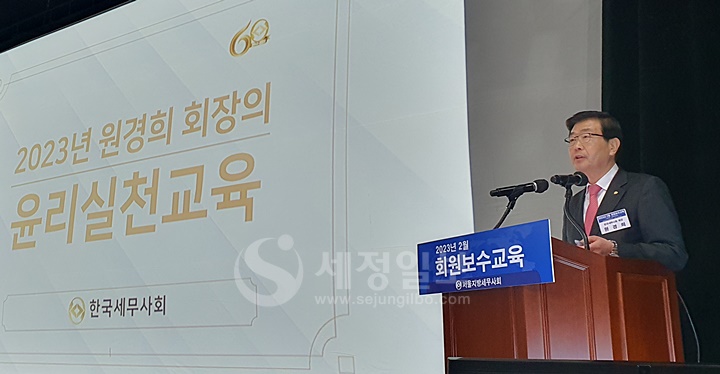
세무대리인들은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조력자다. 이들이 관련 전문자격사법을 지키지 않고 하루가 멀다하고 징계를 받으면서 전체 전문자격사들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이들의 주 업무인 세무대리 전체에 대한 신뢰도까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정일보가 지난 10년(`14년~`24년 현재)간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을 조사한 결과 총 54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마저도 재논의, 재조사, 징계 곤란 등은 제외한 숫자다. 특히 올해 들어 1월을 제외하고 2, 3, 4월 모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14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해 징계위원회로 회부하고, 위원회는 징계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해야 한다.
징계 수위는 직무정지 최대 2년, 등록거부 최대 2년, 과태료 최대 1000만원까지 종류는 다양했다.
탈세를 돕고 명의를 빌려주는 등 전문자격사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오는데도 여전히 이로 인해 징계를 받는 세무사의 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무사 징계 종류는 대략 7개로, 세무사법 제12조에 규정된 성실의무를 비롯해 △탈세 상담 등의 금지 △명의 대여 등의 금지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사무직원 관리 △영리·겸직 금지 △사무소 설치 규정 등이 있다.
지난 10년간 542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한 명이 여러 규정을 동시에 위반하면서 총 565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위반 항목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461건의 규정 위반이 있던 것으로 집계되며 전체의 81.6%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성실의무란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성실하게 기장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성실신고확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부실 검증에 해당해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A세무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장에게 신고 업무를 전담케 해놓고 외부 업무에만 치중했다. A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긴 납세자는 갑작스러운 세금 과소 신고 소식을 받고 세무사사무소에 항의했지만 A세무사는 사무장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를 토대로 세무사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세무사회는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
이 외에도 사무직원 규정 위반이 33건(5.8%), 영리·겸직 금지규정 위반이 27건(4.8%), 탈세 상담 금지규정 위반이 23건(4.1%), 금품제공 금지규정 위반이 10건(1.8%), 명의대여 금지규정 위반 9건(1.6%), 사무소 설치 규정 위반이 2건(0.4%) 순이었다.
최근 세무사업계에는 보따리 사무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 기장 수십 개를 갖고 이직하는 등 불법 세무대리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당시 관할 지방국세청장인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만나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하며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이렇듯 세무대리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지지만, 사실상 징계의 수위가 낮아 여러 차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세무사가 있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와 투명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세무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직을 할 수 있는 직무정지를 넘어 자격박탈까지 할 수 있는 등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