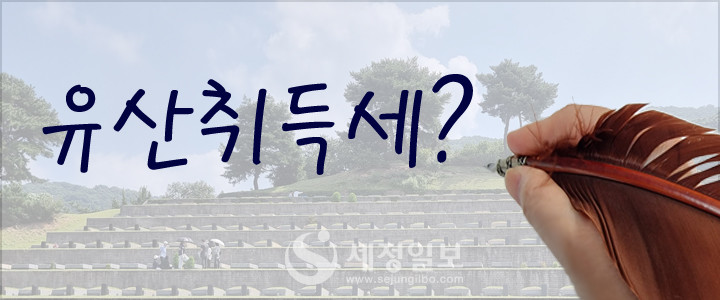
정부가 상속증여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개편 논의라며 더욱 합리적인 세제로의 전환을 예고했던 유산취득세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연기됐다.
윤석열 정부 막바지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은 75년 만의 개편 논의였으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면서 `28년부터 본격 시행을 예고했다.
상속세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한다. 현행인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각자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세금이 결정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자 받은 상속재산 별로 과세한다. 즉, 유산세는 상속해 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 있다.
상속세는 그간 한국에서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이 얼마나 완화되고 있는지, 소득의 재분배 기능으로 작동하는지에 초점이 있었다면 지난 정부에서 유산취득세로 논의가 이루어지며 개인의 담세능력에 의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는지로 초점이 옮겨졌다.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 부담이 결정되는 만큼 과세형평성이 개선되고,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 실효성도 개선할 수 있으며, 상속-증여 간 과세 기준이 일치되기 때문에 과세 범위 합리화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강조했다.
반면, 상속인별 상속재산 확인에 따른 세무 행정 비용의 증가,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 가능성 증가 등 우려가 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개편은 75년 만의 일이라며 개편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며 공론화됐던 유산취득세 개편은 이번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는 것이 이유지만, 당장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환원 등 윤 정부에서 행한 감세 정책을 되돌리고, 지속되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을 메우기 위한 세제개편이 추진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28년도 시행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짧았다는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반대한 바 있다.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가 초래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각종 공제를 하고 나면 상속세를 내는 국민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상속세가 이제는 더 이상 부자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서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1193명이 44조5170억원의 재산을 상속했다. 각종 공제를 제외한 결정세액은 8조1975억원이다. 그 해 사망자 수가 35만8400명이었으므로 약 5.9%가 상속세를 낸 것으로 집계된다. 대다수의 국민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44조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주며 실제로는 8조원의 세금을 냈으므로 실효세율은 18%가량으로 계산된다.
현재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초공제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 뒤 과세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는 1인당 5억원, 배우자는 최대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예정이었다.
지난해 기준 상속재산 가액별로 구분하면, 10억원~100억원을 물려준 억대 피상속인 구간이 4564명, 100억원~500억원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31명, 500억원 초과 구간은 32명 등이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고액 자산가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를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다.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면 상속재산이 쪼개져 누진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연간 2조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상속재산 규모가 30억~100억원일 경우 유산취득세 하에서는 세 부담이 90% 이상 경감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분석했다.
한편, 상속증여세수는 국내에서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큰 세수 규모를 가진 세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