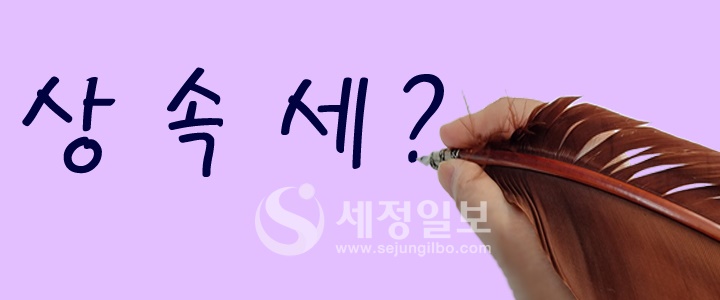
상속세가 과세되는 피상속인 비중이 1년 사이 6.8%에서 5.9%로 약 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세정일보가 최근 10년간 상속세를 내는 이들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지난 `14년~`20년에는 3% 미만이었던 상속세 과세 비중은 `21년 이후 증가하며 `23년에는 6.8%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상속세 납세인원을 늘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
`23년은 피상속인 29만2545명 중 1만9944명이 상속세를 냈다. 그러나 `24년 35만8979명 중 2만1193명이 상속세를 내며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 비중은 5.9%대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상속세 개편을 위해 현행 유산세에서 인별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을 전환할 것을 추진했다. 다만 세수감소가 우려되며 이재명 정부는 상속세에 손대지 않았는데, 야당에서 다시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한 것을 이유로 상속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상속세를 내고 있을까. 먼저, 38개 OECD 회원국 중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4개 국가(`21년 기준)다.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곳 중 10개국은 도입했지만 폐지한 국가로 멕시코,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체코, 노르웨이 등이 있다. 호주, 오스트리아 등 7개국은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 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해 자본이득을 과세하고 있다.
또한, 3개국은 상속·증여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로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가 이에 해당한다. 체코,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는 증여에 한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가까운 가족 간 증여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상속세 폐지 사유를 보면, 캐나다는 `72년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세수가 적어 행정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이 주요 이유가 됐다. 호주는 `79년 폐지했는데, 당시 배우자 상속분 과세에 대한 저항이 컸다. 소규모 유산의 과세가 늘어나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중복부과 등 농장소유주의 반발이 거센 것이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의 경우 세무 행정비용 대비 낮은 세수비중과 경제성장을 위한 유인책 등을 이유로 `04년 폐지됐다. 노르웨이는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증가하고, 가업승계지원 등을 위해 `14년 폐지됐다.
이처럼 나라별로 상속세 부과나 징수 방식은 각기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 중이다.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의 국가는 덴마크, 영국, 미국 등이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 50%이다.
국가별 상속세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일본 55%, 프랑스 45%, 미국과 영국은 40%, 스페인 34%, 아일랜드 33%, 벨기에와 독일 30%, 칠레 25% 등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OECD 평균 세율은 15%이다.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 중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캐나다와 호주는 누진세율로,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단일세율로 과세 중이다. 캐나다는 소득구간별로 15%~33%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특히 캐나다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산하면 최고 54.87%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특히 내년부터는 자본이득이 25만캐나다 달러를 초과하면 자본이득의 66.67%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또한 호주는 0~45%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인데,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은 자본이득의 50%를,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은 자본이득의 100%를 과세한다. 스웨덴은 30%, 노르웨이는 22% 단일세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