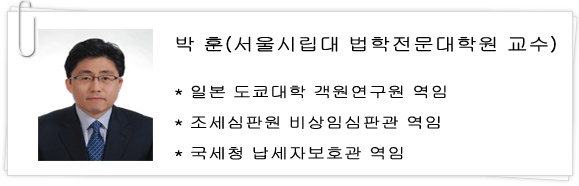2014.1.1.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졌다. 탈세제보에 대한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한편 2011.10.12. 포상금의 대표격이었던 간첩신고 포상금이 16년만에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되었고, 간첩선에 대한 포상금도 이때 1억 5천만원에서 7억 5천만으로 인상되었지만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금액 자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의 경우 탈세제보 처리건수 10,699건중 5,789건이 활용되어 522,351백만원이 추가징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세 제보된 것중 54% 정도가 활용되었고 활용된 제보건을 1건당 90백만원 정도의 세수입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의 경우는 2012년 지급 건수가 156건으로 총 지급액은 2,620백만원, 1건당 지급액은 17백만원으로 나타난다. 포상금으로 국가가 1건당 17백만원을 지급하는데 들어오는 세수입은 90백만원이기 때문에, 나가는 돈 대비 들어오는 돈이 5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보면 탈세제보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말할 만하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가 올라간 것도 이러한 효과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지어 논의가 된바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고객의 탈세정보를 제공한 은행 전직직원에게 1억 400만달러를 포상금으로 주고 해당 은행으로부터 7억 8000만 달러의 추징금과 벌금을 부과했다는 신문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포상금 규모나 징수액 규모의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한다. 탈세제보를 포상금과 관련지어 운영하는 경우 이처럼 탈세제보자에게 팔자를 고칠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세무행정에 큰 변화는 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상금 한도가 크게 인상되었지만 한도 자체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아직 공개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2013.7.1.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이면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이면 7천 5백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 20억원 초과이면 2억 2천 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5%가 각각의 포상금 지급률이다. 액수가 큰 경우 탈세제보를 통해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게 되면 걷은 세금의 5% 정도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한도가 늘긴 했지만 20억이다.
한도 제한을 두어야 할까? 한도 제한을 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현재 인터넷 검색을 하면 탈세제보를 통해 포상금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여러 정보 등이 떠 다니고 있다. 조세정의를 세우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탈세사냥을 하는 업이 새로운 직업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정도이다.
한편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놓고 탈세제보자와 국가간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다. 2013.8.16.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395)에서는 2010년 세금탈루사실을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 제출과 함께 회사의 법인세 탈세제보를 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기는 했는데 포상금 금액에 대해 다투었는데 1심에 이어 포상금 지급이 적절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13.7.18.의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13부0911)에서는 2009년 부동산 양도가액 과소신고 등에 대해 6건을 제보한 탈세제보자가 포상금 금액에 대해 다투었는데 과세관청의 계산이 맞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13.5.6.의 국세청 심사결정례(심사기타2013-0006)에서는 2012년 법인의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에 대해서 탈세제보를 한 사람이 포상금지급을 못 받은 것을 다투었는데 피제보법인의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탈세제보를 해도 포상금을 항상 받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 심사, 조세심판원 심판, 법원 등 포상금 지급여부, 지금금액의 정도를 놓고 다툼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국가로서는 세무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내부자에 의해 탈세제보를 받아 세수확보를 하는 것 자체는 효율의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탈세제보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탈세제보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까? 탈세제보 포상금의 한도는 없애고 피제보자를 괴롭힐 목적이나 피제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두는 것은 어떠할까? 세금을 탈루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탈세과정에서 그 상황을 잘 아는 내부자로부터 언제든 탈세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도록 하여 차라리 세금 제대로 내는 것이 비용적으로 더 낫다고 만들어 주는 것이 현 시점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제보거리를 찾는 사람과 피제보자간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제보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과세관청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칫 너도 나도 탈세제보를 한다고 하여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이상한 사회분위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조세정의는 세워야 하는 것이고 국가의 힘이 못 미친다면 시민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다. 탈세제보만으로 포상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실제로 탈세제보를 통해 세수입의 확보가 되는 전제로 그 일부를 포상금으로 주는 경우라면 지급하는 기관의 예산한계로 포상금의 한계를 둘 필요는 없다. 국세청의 경우도 탈세제보의 양과 질을 분석을 해서 탈세제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다시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탈세제보자의 경우 탈세제보 이후 처리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 탈세제보자의 권리의식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탈세제보자가 악성민원인으로 변하지 않도록 탈세제보자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조세정의의 수호자가 되는 탈세제보자가 양성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