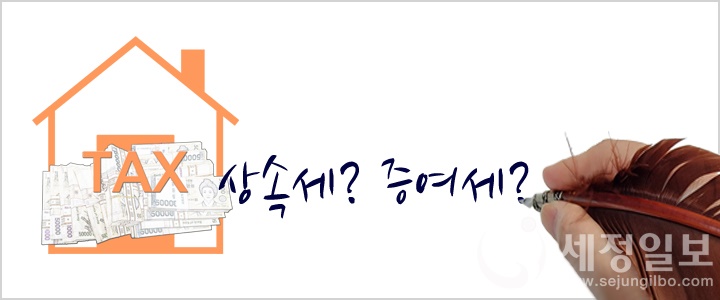
인터넷에서는 ‘국세소멸’로만 검색해도 국세가 소멸된 것이 맞냐는 질문부터, 오랫동안 안 낸 세금을 면책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세무법인의 광고까지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
국세소멸시효는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날부터 5억 미만의 세금은 5년, 5억 이상의 세금은 10년이다. 수억대의 국세를 안 내고 버틴다며 다른 가족 명의로 모든 금융거래를 해 5년간 철저히 숨겼다는 후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자들이 지방세 제외하고 오로지 ‘국세’만으로도 무려 106조원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세수만 335조6723만원이므로, 국세청이 한 해 거두는 세금의 31.6%가량은 징수하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작년에는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56조4000억원)을 겪었는데, 올해(5월 기준)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었던 작년보다 15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또한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고, 나랏빚은 1146조8000억원으로 5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적신호다. 삼쩜삼과 같이 세금 환급 플랫폼에 이어 체납 세금 소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국세24’ 등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4월 한 달 이용자만 1만5000명을 넘어섰다고 소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년부터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다. 폐업 영세사업자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세목 중에서는 부가가치세 체납이 가장 많다. 작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2956억원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한다. 뒤를 이어 소득세 2515억원, 양도소득세 1247억원, 법인세 986억원, 상속·증여세 34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법인세는 이미 내렸다. 특히 상속세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편 의지(유산취득세로)가 강하다. 세금이 과도해 기업승계가 어려워 고용이 위태로워지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집값이 오르면서 상속세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물려진다며 이제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주장한다. 상속세를 낮추자는 주장은 집값이 치솟은 ‘서울 표심’을 잡기 위한 최고의 카드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근로소득으로 부를 얻는 속도가 거대한 부의 세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23년 기준 누계 상속·증여세 체납 건수는 1만8808건이다. 반면, 지난해 피상속인 수는 1만8282명이고,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이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무려 66조4000억원에 달한다. 인원수로만 따진다면 한 해 동안 상속받는 인원의 수보다 더 많은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작년 한 해 발생한 상속·증여세 체납액만 하더라도 1조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상속세를 줄여주는 것보다 먼저 부를 세습하면서 세금까지 안 내는 사태부터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납하는 악성 체납자만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 최근 일선 세무서에서 반년간 무려 6억1200만원을 빼돌린 국세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씨는 체납 징수금 보관 통장에서 가족 계좌로 거액을 횡령했다. 국세청 내부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