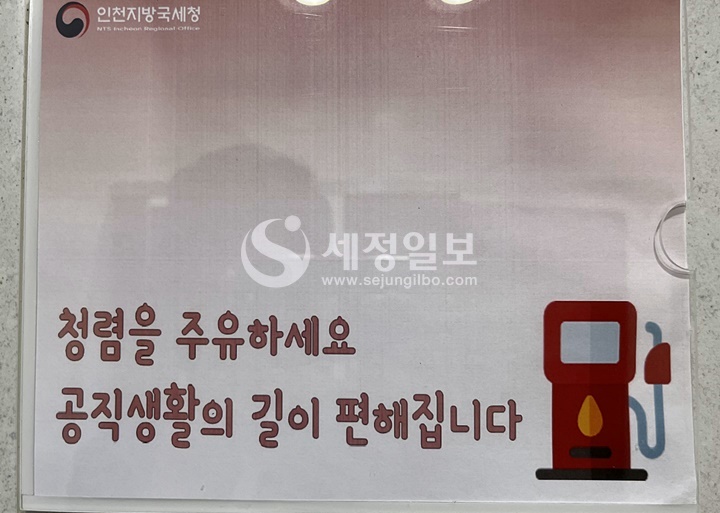
‘무관용’, ‘일벌백계’. 국세청의 비위 국세공무원에 대한 대응 원칙이다.
특히 국세청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 중에서도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 공직자들의 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외부인의 손에 칼을 쥐여준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 청렴도는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도 감사원에서 드러났듯, 중부청 소속 조사관이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약 1년의 시간 동안 6700만원을 횡령하는데도 지방청은 물론 본청 감사에서도 이를 적발해 내지 못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세청 직원들이 평가하던 ‘내부청렴도’는 1등급을 유지하던 지난 시절과 다르게, 윤석열 정부인 `22년~`24년은 2~3등급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역대 국세청의 내부청렴도는 등급제 표기가 시작된 `09~`11년까지 1등급을, `12~`16년까지 2~3등급을 유지하다가,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1등급을 유지했고, `20년도에 3등급으로 하락한 뒤 다시 `21년도 1등급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단 한 차례도 내부청렴도 1등급을 기록하지 못했다. 내부에서 바라본 시각에서도 국세청 청렴도는 낮았고, 전체적인 종합청렴도도 하위권인 3~4등급을 기록했다. `22년 종합청렴도 등급은 4등급, `23~`24년도 종합청렴도 등급은 3등급이었다. `22년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으로 공직자의 청렴도를 더욱 높이는 해였지만 세정협의회 사건 등이 영향을 미쳐 청렴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왜 국세청은 ‘무관용 원칙’에도 청렴 수준은 하위권을 기록했을까. `20년 말 공직 퇴임 세무사들의 1년 수임제한 규정도 만들어졌지만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등 비위 사건이 지속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A모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관내 세무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서울청 징세관으로 근무했던 B부이사관의 뇌물수수 혐의, 지방청 조사국 직원들이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해 구속되는 등 사건·사고가 계속 이어졌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2년 금품수수, 기강 위반, 업무 소홀 등으로 총 64명이 징계를 받았고, `23년에는 75명이 징계를, `24년 6월까지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1년도에 50명이 징계를 받은 만큼 고강도 감찰과 청렴 교육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징계를 받는 인원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세청은 비위가 발생한 세무서에 대해 특별 복무 감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취하고 있다.
